2023. 2. 14. 09:46ㆍ세계문학전집

댈러웨이 부인은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이다. 하룻동안 벌어지는 일이다. 댈러웨이 부인이 제목에 있으니 당연히 댈러웨이 부인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생각했다. 막상 소설을 읽으니 이게 꼭 그렇지 않았다. 댈러웨이 부인을 기준으로 다양한 인물이 나온다. 보통 이렇게 인물이 나올 때는 댈러웨이 부인의 관점에서 본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각자의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중심은 댈러웨이 부인이 된다. 이 소설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 소설은 모더니즘 작품이다. 뭔가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소설이 전개된다. 이런 형식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대표적이다. 읽고자 욕심만 내고 엄두를 내지 못한 소설이다. <댈러웨이 부인>을 읽어보니 역시나 이유가 있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더니 소설의 내용을 쫓아가는 것이 힘들었다. 댈러웨이 보인이 파티를 주최하고 끝내는 것까지 전체 내용이다. 그럼에도 읽는데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였다.
소설에서 새롭게 인물이 등장하면 해당 인물의 관점에서 모든게 진행된다. 댈러웨이 부인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댈러웨이 부인의 생각과 시선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다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관점과 생각과 시선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한 마디로 댈러웨이 부인과는 1도 상관없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댈러웨이 부인이 누군가를 만났다. 그렇다면 보통 댈러웨이 부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묘사하고 서로 사건이 진행된다. 상대방의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도.
이 소설은 그렇지 않다.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 그 사람 관점에서 모든 게 진행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댈러웨이 부인과 사연이나 생각에 대한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이 흐른다. 댈러웨이 부인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한다.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 틈도 없이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난다.
또 다른 인물이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해댄다. 이러다보니 솔직하게 책을 다 읽었지만 이렇다하고 기억나는게 많지 않았다. 의식의 흐름대로 내용이 전개된다고 할 때 내가 제대로 의식이 없었나 보다. 그나마 제목에 등장했으니 댈러웨이 부인과 셉티머스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댈러웨이 부인이 파티를 주최하며 사람들을 초대한다. 초대하지 않았지만 셉티머스가 러시아에서 돌아온다. 댈러웨이 부인과 썸이 있었는데 현재는 헤어진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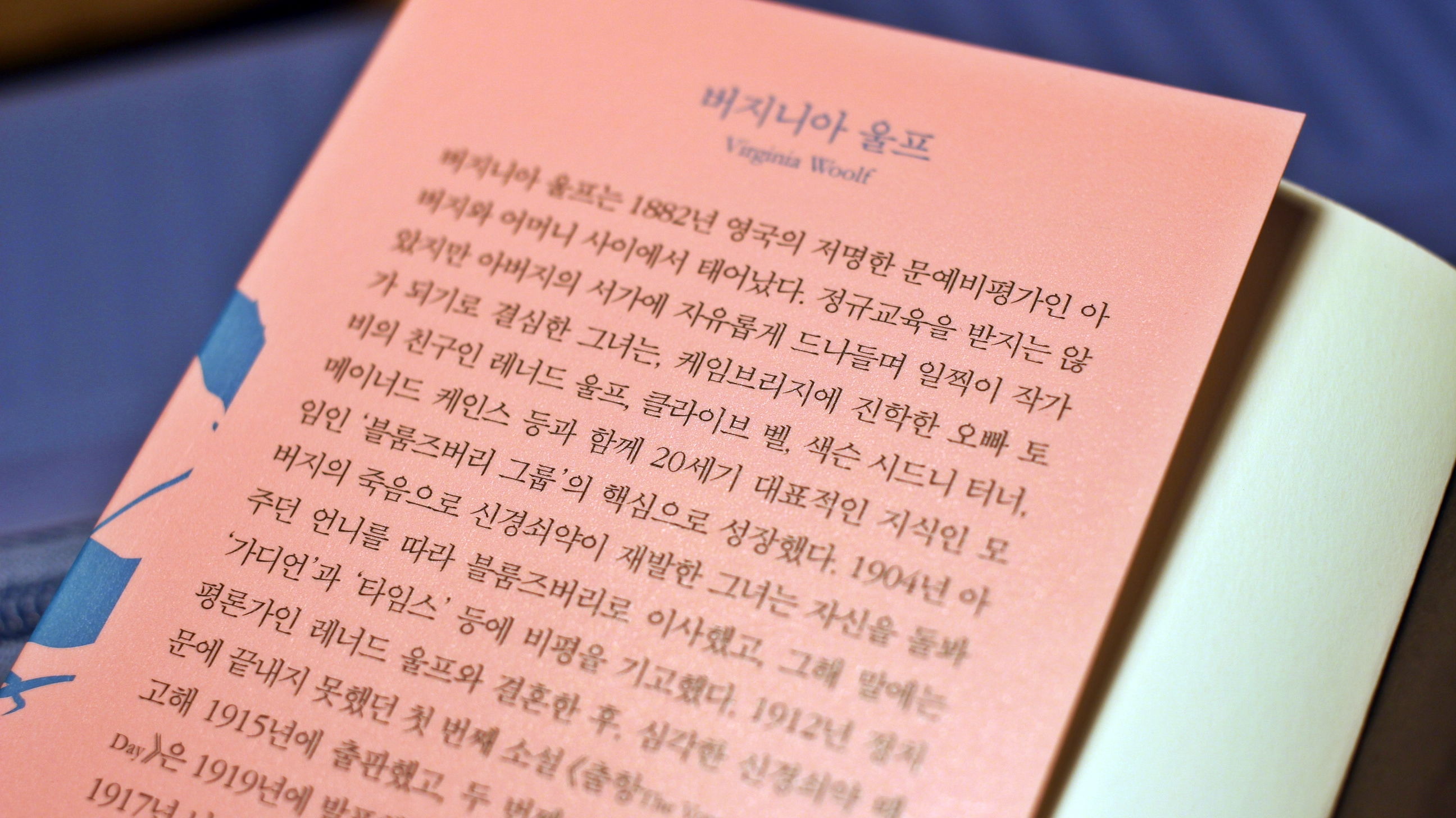
댈러웨이 부인이라는 표현처럼 현재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다. 셉티머스는 다른 여자와 사귄걸로 나오는데 여전히 댈러웨이 부인에 대해 잊지 못하고 있다. 또는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댈러웨이 부인을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다. 군인이었으나 현재는 낙오자라고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셉티머스에 대해서는 꽤 길게 설명하는데 그마저도 다소 빠른 시간 내에 퇴장한다. 그러니 뭔가 특정한 인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뭔가 적응 되기도 전에 다른 인물로 교체된다.
또한 초반 적응이 힘들었던 건 달러웨이 부인이라고 호칭이 나오지 않고 클라리사라고 한다. 풀 네임이 클라리사 댈러웨이 부인이다. 그러니 친근하게 부를 때는 클라리시고, 격조 있게 부를 때는 댈러웨이 부인이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작품을 볼 때 대체적으로 주인공과 주변 몇 명의 인물로 좁힌다. 그래야 작품을 보는 사람이 어렵지 않다. 우리가 누군가를 새롭게 알게 되면 한동안 그 사람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각자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모임에 갔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면 기억도 남지 않는다. 그 사람마저도 이야기를 좀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만나도 가물가물하다. 실생활에서도 이럴진대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더욱 심하다. 그러니 최대한 인물을 좁혀 설명한다. 그렇게 해도 주인공이나 기억한다. 이를 방지하는 건 비중있는 조연이거나 인지도 있는 사람이 출연할 때다. <댈러웨이 부인>은 그런 면에서 읽기 힘든게 당연하다. 내가 이 책을 읽어 단 한 명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 댈러웨이 부인이나 셉티머스도 그나마 이름이 자주 나와 기억하는 정도일 뿐이다.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이 책에 대해 이런 표현이 있다.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롭다.' 그럴 수밖에 없다. 보통 어지간해서 같은 책을 2번 읽는 경우가 없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또 읽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댈러웨이 부인>은 또 읽을 필요가 없을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읽어도 분명히 새로울 듯하다.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읽을 때마다 새롭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본다. 워낙 명성이 높은 책이라 내가 읽었다는 건 분명히 인식한다는 점이 거부할 듯하다.
이 책을 읽으려고 도전할 때마다 너무 힘들게 읽었는데 또 읽어야 할까..하고 말이다. 한편으로는 댈러웨이 부인은 파티를 주최할 정도로 풍요로웠다. 자신에게 최대의 일이 바로 파티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그건 당시에 어느 정도 사는 집에서는 당연한 일과였다. 그게 꼭 무료한 삶을 버티는 힘은 아니라고 본다. 당시를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언제나 맥락을 알아야 누군가를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댈러웨이 부인의 맥락을 제대로 몰라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함께 읽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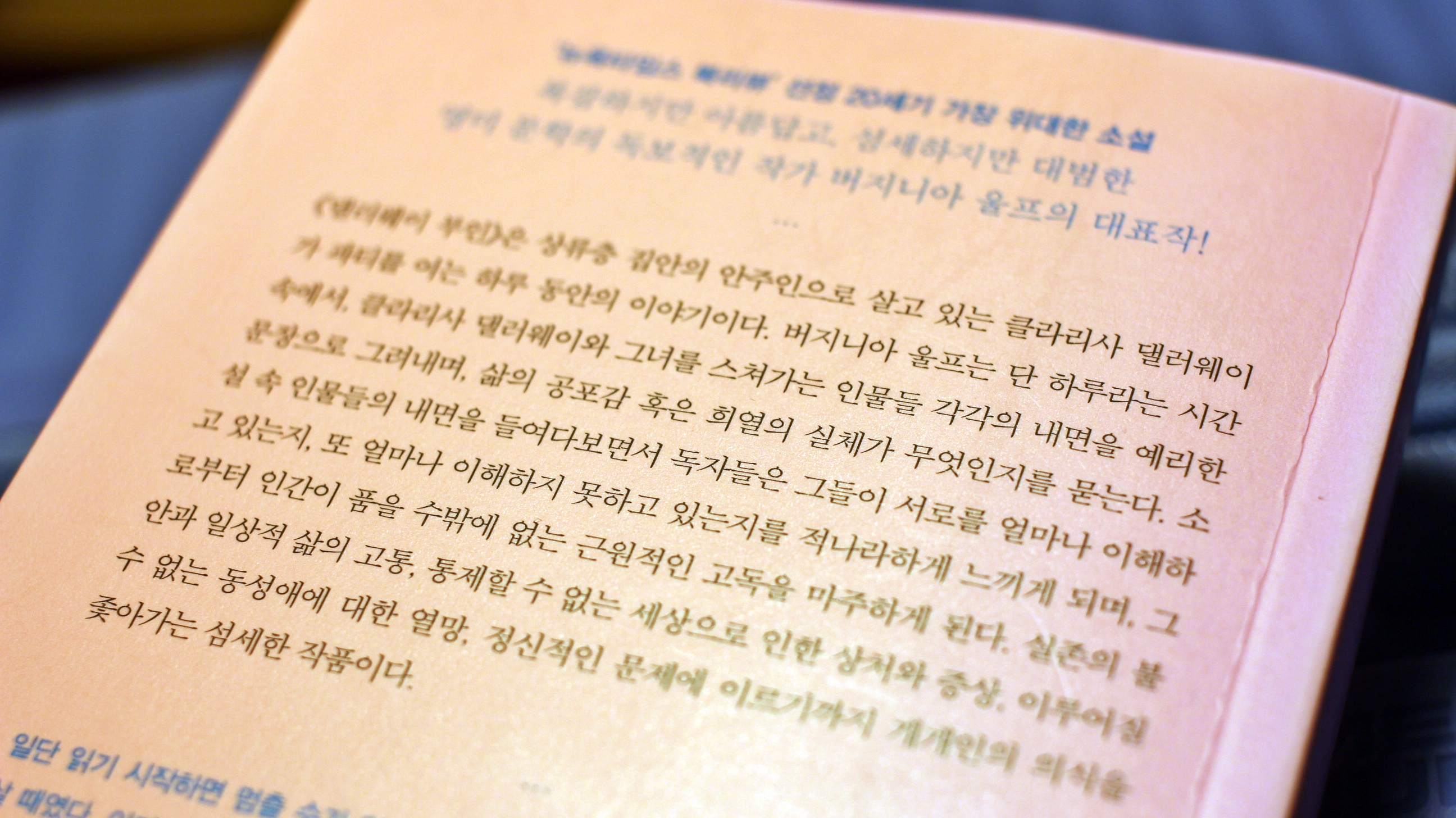
'세계문학전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홍글씨는 내가 떼지 않는다 (0) | 2023.03.07 |
|---|---|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무엇을 했을까? (0) | 2023.02.28 |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0) | 2023.01.30 |
| 올랜도 - 남자에서 여자로 (2) | 2022.11.11 |
| 픽션들 - 보르헤스 전집 2 (0) | 2022.10.19 |


